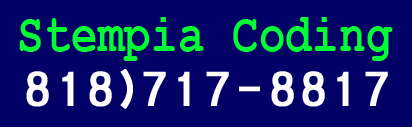원로 오문강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선생님 꽃 속에 드시다>를 펴냈다. (시산맥사 발행)
두 번째 시집을 낸지 13년에 펴낸 이 시집에는 <나 본 듯이 보거라> <우리 국어 선생님> <나성 문화재 1호> 등 39편의 신작시와 산문 1편을 4부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오문강 시인의 작품들은 일견 일상의 소소한 경험들을 그려놓은 것 같지만 마치 물 한 방울에 세계를 담듯이 삶이라는 문제를 숙고하게 한다. 평이한 듯한 진술 속에 시인의 비범한 성찰적 시선과 태도가 돋보인다.”
평론가 방민호 교수(서울대 국문과 교수)의 추천의 말이다.
시인의 말은 한결 질박하고 정직하다.
“시가 나를 버리지 않게, 내가 시를 버리지 않게, 애쓰지 않고 덤덤하게 같이 오래 살았다. 자랑도 아니고 흉도 아니지만, 간절하게 쓰고 싶을 때가 많지 않았고, 운동을 좋아해서 공 치고 노는 데만 정신을 팔았다.
시집을 낼 만큼 시가 충분하지 않아 산문 한 편을 뒤에 넣기로 했다. 이 산문은 나에겐 내 시의 역사이기도 하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오문강 시인은 마산 출생으로, 숙명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1986년 <현대문학> 추천을 받아 시인으로 등단했고, 미주시인상, 미주문학상을 수상했다.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시집 <까치와 모국어> <거북이와 산다> <선생님 꽃 속에 드시다>를 펴냈다.<*>
< 우리 국어 선생님 >
오문강
난 선생님이 책 읽으실 땐
언제나 선생님 눈만 쳐다봤다.
국어책은 선생님을 춤추게 했고
읽으실 땐 눈빛이 달라졌다.
꽃빛 같은 햇살이 선생님 눈에서 막 쏟아졌다.
창밖의 나뭇잎들이 수군거리고
우린 민들레만 쳐다봐도
꽃빛이 번져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들의 국어 시간엔 사계절이 없었다.
일 년 내내 봄. 봄. 봄이 오고 봄이 또 봄을 불렀다.
-<우리 국어 선생님>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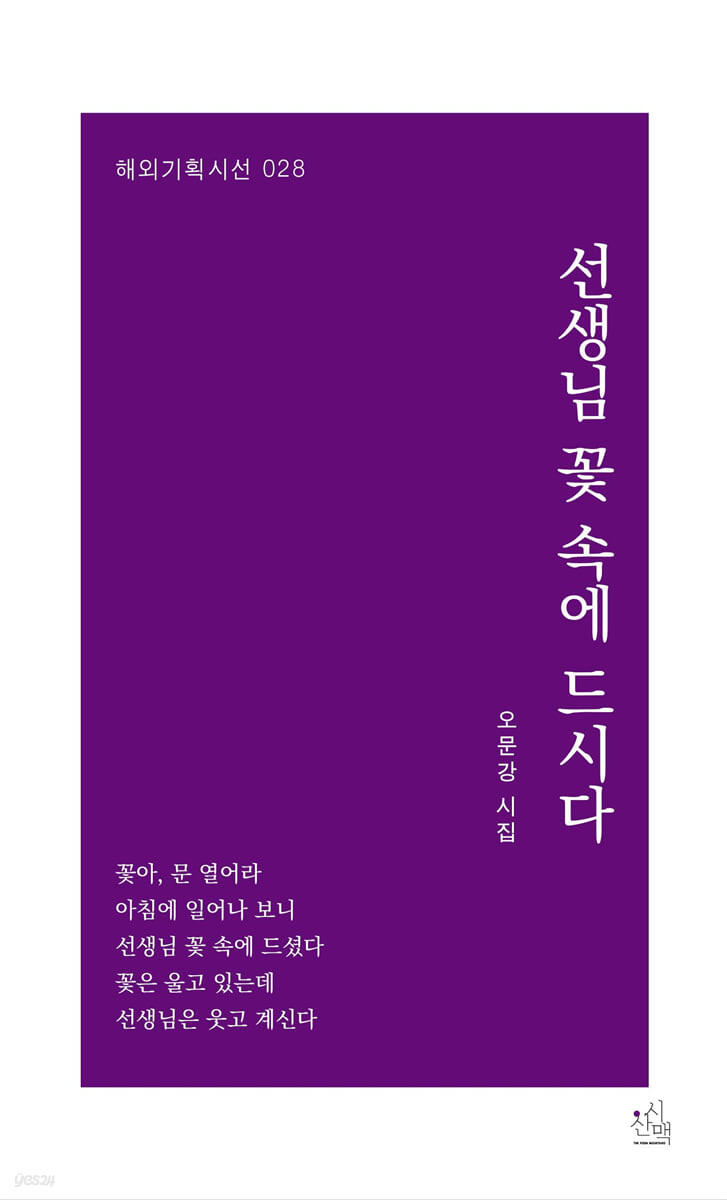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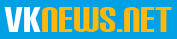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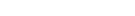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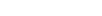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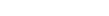


 LA강 주제, 작가 11명의 특별기획전
LA강 주제, 작가 11명의 특별기획전
 <책소개>-장소현 소설집 <그림 그림자> 발간 ‘이야기...
<책소개>-장소현 소설집 <그림 그림자> 발간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