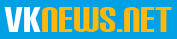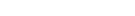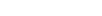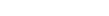지울 수 없는 이름, 가족
김화진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드라마 시청은 중독성이 있다. 혼자되신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동안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 일은 일상의 큰 과제였다. 당시엔 유난히도 역사극이 많았는데 아버지 또한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했지만, 흥미 위주로 각색된 드라마를 즐기셨다. 한 시대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새로운 임금이 권좌에 앉게 될 즈음이면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곤 했다. 여든 아홉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아버지는 인생 종반의 많은 시간을 비디오 화면 앞에서 흘려보내신 셈이다.
아버지께서 노년의 삶의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데에 연속극 시청만큼 좋은 건 없었으리라. 긴 시간을 돌아 이제는 아버지도 세상에 계시질 않고 내가 얼추 그 나이가 되었다. 원래 텔레비전 시청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 키우기만으로도 바쁜 시절이었다. 다른 데에 눈 돌릴 틈도 없이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되돌아보아도 전혀 억울하지 않고 아무런 후회도 없이 오히려 아련히 그리운 기억마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집은 딸만 넷이다. 그중 나는 막내다.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 종가의 맏아들인 아버지, 그 시대에 아들 하나를 두지 못했다는 것에 엄마가 받았을 고통이 얼만큼이었을지 짐작이 간다. 지금은 오히려 딸을 가진 부모가 이렇게 행복한 시절이건만. 큰언니와 나는 띠동갑이다. 자랄 때에는 엄청난 차이를 느꼈지만 팔십이 가까운 맏이와 칠십에 다가가는 막내의 차이가 지금은 그저 내가 조금 젊은 할머니로 보인다는 것뿐인 듯하다. 모두가 늙어가는 나이지만 여전히 언니들에게 나는 영원한 막내 동생이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내 가족이 되겠다고 희망한 적도 없다. 어쩌면 사람들이 일컫는 운명이라는 이유일 테다. 요즈음 소위 금수저, 흙수저라고 말하는 각자의 태생을 그 누구라도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부모의 피를 이어받고 동일한 성씨에다가 이름 중 한 글자까지도 돌림으로 공유하는 밀착된 관계다. 그 뿐이랴, 거리에 나서면 형제자매 간이 어디든 닮은 데가 있어 묻지 않아도 한 식구임을 짐작케 한다. 거역할 수 없는 관계의 법칙이다.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자매는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하나마저 힘들어하고 감정까지도 함께 느낀다지 않는가. 인위적으로 맺어줄 수 없는 신비한 관계, 그것이 가족이다.
혼자 사는 방법을 체득하였다. 텔레비전을 마련하고 인터넷 방송을 신청했다. 각종 프로그램이 매일같이 새롭게 올라와 있다. 다큐멘터리도 흥미롭고 드라마도 다양하다. 사극에서는 재미를 느낄 수 없으니 드라마를 섭렵해 볼까나. 나이가 든 탓인지 복잡한 내용도 싫고 심각하게 앞뒤 생각하며 봐야 할 이야기도 머리가 아프다. 잔인한 화면은 더욱 볼 마음이 없다. 이리저리 연속극을 골라 1, 2회 정도 시작을 보면 대충 어디로 전개될 것인지 예측이 된다. 가장 마음 가볍게 따뜻한 인간애가 드러나는 가족 드라마가 역시 시청하기에 편안하다.
은퇴 후의 삶, 나는 한국 가족 드라마에 빠져 일상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무리 부정해도 지워지지 않을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랑으로 중독된다면 좋겠다. 때때로 뉴스에 오르는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아픈 일들이 사랑의 결핍 때문은 아닐까. 기쁜 일은 당연히 누구와도 나눌 수 있지만, 힘들고 아파할 때 아무 것도 묻지 않고 내편이 되어주는 일은 사람을 살린다.
혼자 있어도 오늘 나를 기억하는 가족이 있기에 외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