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 피는 꽃
김화진
<재미수필문학가 협회 회장>
마당이 초록빛으로 출렁인다. 지난 겨울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봄과 함께 뒤늦게 찾아와 땅을 적셨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들풀들이 한꺼번에 키 자랑이라도 하듯 매일매일 커 간다. 시골스러운 내집 넓은 마당이 계획된 선을 따라 만들어 놓은 멋진 정원보다 못한 게 없다. 강아지풀을 닮은 한 무리가 바람 부는 방향을 따라 흔들리는 모양이 간지럽다.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난 나는 자연의 정취를 잘 모른다. 3월 새학기를 맞을 때면 교정에 피어나는 개나리에서 봄을 느꼈다. 꽃밭에 철따라 피어나는 다른 색깔의 꽃을 보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아 차렸다. 그땐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워서 붙잡고 싶다기보다는 빨리 지나가 어른이 될 날을 기다렸다. 혼자만의 세상에 자유로이 날아올라 어디든 닿아 마음껏 삶을 펼쳐놓을 희망을 꿈꾸었다. 어느새 지나온 뒤를 돌아보며 쌓아놓은 이야기를 떠올리기가 앞에 보이는 길을 찾기보다 훨씬 가벼운 일이 되었다.
낮기온이 제법 높아졌다. 엄청나게 키가 크고 몸통도 굵은 선인장에 아기 얼굴만한 꽃들이 피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을 만큼 가시도 길고 뽀죽한데 노란 빛을 띈 하얀색이라서 더욱 우아하게 보인다. 사람을 비롯하여 어떤 물체라도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일은 매우 경솔하다는 느낌이 든다. 담장을 따라 길게 넝쿨져 올라간 부겐베리아의 빨간 꽃은 줄기마다 빼곡하게 무리지어 합창을 한다. 그 옆으로 오렌지와 레몬나무도 하얀 향내를 퍼뜨리고 있다. 정말 봄이 내 뺨을 스치며 발 아래로 내리고 있다.
잡초를 마냥 놓아둘 수는 없다. 모처럼 햇볕과 마주 앉아 마당 한 귀퉁이부터 정리를 시작했다. 아욱 잎사귀와 비슷하게 생긴 야생 제라늄이 얼마나 질기게 자라 있는지 곧 정글이 될 판이다. 이웃집과 담장 가까이에 작은 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 큰 나무 뒤에 가려져 집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 꽃이 있었다. 그것도 보라색, 분홍색, 흰색이 섞여있었다. 신기해라. 가지마다 삼색이 잘 어우러져 초록 잎사귀가 더욱 돋보였다. 나무 이름이 궁금해 찾아보았다.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라 한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니….
나뭇가지는 좀 말라 있었다. 생전 물을 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꽃까지 피워냈는지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집안에 두고 보려 가지 몇 개를 꺾었다. 하얀 꽃병에 꽂으려는데 자꾸만 가지가 아래로 숙여든다. 어느 하나 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
꽃대를 곧추세우는 데에 쓰는 집게로 두세 가지씩 묶어주니 그제야 목을 들어 올렸다. 정말 예쁘다. 꽃향도 진하지 않고 은은하여 내 마음까지 차분해졌다.
어제가 보라색이었을까. 꽃 색깔의 순서가 그렇게 말한다. 점점 엷어지다가 시들어 떨어질 때엔 하얀 색의 꽃잎이 진다고 한다. 우리 삶의 어제는 그렇게 선명한 색깔로 시작했고 오늘은 약간 엷어진 분홍빛으로, 내일 더욱 하얗게 바래지는가. 게다가 그렇게 청초한 꽃을 매달고 왜 그리 고개를 떨군 채 늘어져 있었는가. 당당할 수 있었는데, 자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예쁜 꽃인데.
꽃이름의 의미를 내가 정하기로 했다. 열정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빨강과 무한한 꿈을 연상하는 파랑을 혼합하면 보라색이 된다. 삶의 꿈을 수 없이 그리던 시절,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긍정이었다. 그렇게 이어온 삶의 중반에 들어서면서 서둘지 않고, 느리지만 부드럽게 안정적인 시간으로 채웠다. 분홍빛이 가진 따뜻함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며 오랫동안 머무는 인생의 터를 다졌다.
삶의 내일인 하얀색은 텅 빈 느낌을 준다. 빨강, 파랑과 초록을 완벽하게 섞으면 흰색이 된다고 한다. 열심히 달려온 어제와 살아 움직이는 오늘, 아직 오지않은 내일은 평화와 비움으로 남아야 할 약속의 시간이 되리라. 낮은 마음으로 고개 숙이는 겸손함을 더한다면 낙제 인생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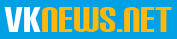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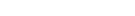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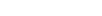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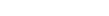


 지울 수 없는 이름, 가족 - 김 화진
지울 수 없는 이름, 가족 - 김 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