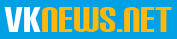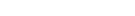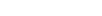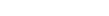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에겐 조국을 떠나 쉽지 않은 이민생활에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낸 형님이 있었습니다. 집안 내력이 있어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시던 형님이 2년 전에 모든 것을 뒤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었기에 상상도 못 한 일이 갑자기 4개월 만에 벌어져 지금까지도 믿기지 않고 먹먹합니다. 운동도 좋아하시고 잘하셔서 언제나 따르고 함께 운동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행복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배드민턴을 같이 하자고 수년을 넘게 말씀하셔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못 이기는 척 시작한 것이 이제는 생활이 되었고, 평생을 운동도 안 하던 아내까지 형님의 권면으로 시작했으니, 저희 부부에게 참으로 큰 행복을 주고 가셨습니다.
13년 동안 부동산 파트너로서 많이 이끌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돼 주셨던 형님이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생각나실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시던 얘기를 글로 쓰셔서 오래전에 칼럼으로 기고하신 적이 있는데, 그 글로 고 김 명 형님의 그리움을 달래보고 싶습니다.
그때 나의 어머니
다들 사연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 참 너무 일찍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숨 좀 돌리려니 눈앞에 죽음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짧은 나이로 떠나실 것을 왜 이 세상에 오셨냐고 우리 아들 넷과 딸 하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십 중반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의미의 형체가 어렴풋이 잡힐 때 즉, 불효함 그리고 누구에게 보다도 만만하게 상대하며 그것이 자식에게만 부여받은 특권인양 오해했던 우리들의 죄과를 이제야 고백할 때가 되니, 내 나이 어머니의 나이를 지나가며 벌써 자식들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모 의대 병원을 들어설 때 까지만 해도 65킬로의 거구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시며 담석증이 병이냐 하시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한 달 삼일을 입원하시고 뼈 가죽만 남아 제 품 안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며칠 후면 어머님의 기일입니다. 그동안‘엄마’에게 못다 한 가슴속에 있었던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너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원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춘기 때부터 엄마 속을 무던히도 썩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재촉하는데 한몫을 한 제가 정신을 차렸는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을 때의 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한 달 동안 하늘나라에 보내드릴 때까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 모든 환자를 그렇게 했나 봅니다. 몸속에 가래를 뺀다고 콧구멍에 호스를 집어넣어 전기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엄마는 키도 크시고 몸도 한 몸을 하셨지요. 그 몸이 스위치를 작동할 때마다 전기 충격으로 십 센티 정도 튕겨 오릅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는데 엄마의 초점 없는 시선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도 사인에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온 중창 팀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제가 듣기엔 그 화음이 조잡한 소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축 쳐진 손으로 저를 부르시며 문을 열어 달랍니다. 제 귀에 들리는 불협화음이 엄마의 귀엔 천사의 소리입니다. 좀 더 크게 듣고 싶으신 것 같아 다른 병동으로 이동하는 그들을 쫒아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라며 부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국에 올 때까지 병원 중창단 선교는 한 주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저를 또 손짓으로 부릅니다.“명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저는 그 부탁이 뭔지 압니다. 머리를 감겨달라는 것이죠. 병원에서 말하기를 암 환자는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엄마가 또 조릅니다.“얘야,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한번만 감겨줘”. 엄마의 코앞에 다가온 죽음을 몰랐던 저는‘까짓 거 마지막 부탁이라는데 그것 못하랴’ 선심 쓰듯 엄마의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로 갑니다. 서시지도 못하는 엄마의 머리를 세면대에 가까이 붙이고 그것도 찬물로 감겨 드렸습니다.‘너무 시원해’하시는 엄마의 그 얼굴. 만족하신 얼굴을 바라보면서 바보같이 뿌듯해하였던 것,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매일 환자복을 바꿔드립니다. 알몸의 엄마를 물수건으로 닦아 드리면서 새 가운으로 입혀 드립니다.
어느 날입니다. 소변은 호스로 해결하는 엄마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십니다. 화장실에 가서 일단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엄마를 내려서 변기에 앉히고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의 변을 파내는 일입니다. 나중에는 엄마의 마른 변을 손톱으로 파냈습니다.
몸가짐이 반듯하셔서 아버지 앞에서도 옷을 갈아입지 않으셨다는 엄마. 이미 여자이기를 포기하셨겠지요. 여자로서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였습니다. 퇴원을 결정한 마지막 날 밤입니다. 매일 했던 일이 오늘 밤은 아주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본능이죠. 엄마의 귀에다가 성경을 읽어 드립니다. 다른 사람 깰까 아주 조용히, 소곤소곤 읽어 드렸습니다.
유난히 좋아하셨던 찬송가가 있습니다.“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엄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후렴까지 몇 번을 불러 드렸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보내 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손을 놓았습니다.
마음에 먹먹한 통증이 옵니다. 가슴이 아련해지는 게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조차 불러보기 힘든 말. 그냥 혼자 읊조립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엄마를 만나게 되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너무 미안했어요.” 살아 계셨을 때 정말 잘해드렸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