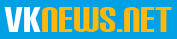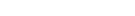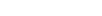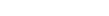사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하는 나는 이월로 접어들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비도 며칠 왔으니 이제 산책로에도 이름 모를 야생화가 필 것이며, 나무들도 더 싱싱해지겠지…
우리 동네에는 요샛말로‘백만 불짜리 산책로’가 있다. 이런 멋진 산책길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행운이다. 왕복 3.4마일이라 빨리 걸으면 1시간 10분이나 20분 정도가 걸리니 딱 맞는 시간과 거리이다. 하루에 만보를 걸으라 하지만 이렇게 걷고 나면 팔 천보 이상이 되는 것 같다. 정기검진을 하러 가면 첫 번째 질문이 운동하느냐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산책길은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어느 깊은 산골에 와 있는 것 같다. 옆으로는 깊지 않은 낭떠러지로 계곡이 파여 있는데, 그 아래로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어 몇 개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일부러 돌멩이를 헛딛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아무도 없을 때는 징검다리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을 떠서 세수를 해보고 싶기도 했다. 물은 맑고 깨끗해서 한 움큼 손에 담으면 시원한 기운이 온 몸에 퍼져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득 황순원의 <소나기>가 생각났다. 누군가 이 징검다리에서 내 손을 잡아 줄 것만 같아 주위를 휘둘러보게 된다.
로스앤젤레스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곳이라 해도 시냇물은 끊이지 않고 흐르는데, 어느 해에는 많은 비로 인해 징검다리 위로 넘쳐 건너갈 수가 없게 된 때도 있었다.
물속에 잠긴 징검다리 돌에 시선을 모아봤다. 끊임없이 밟히기만 했던 돌이 오랜만에 온 몸을 물속에 담가 깨끗하게 씻기고, 잠시나마 쉬고 있는 모습이었다. 물에 잠긴 돌처럼 모든 잡다한 생각들에서 벗어나 잠시 나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솔길이 있는가하면 두세 명이서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폭넓은 길도 나오고 가다보면 언덕도 나왔다.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겨우 걸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양쪽에 나무가 자라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있다. 마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곳에 벤치만 놓여 있다면 데이트 장소로도 안성맞춤일 것 같았다. 그 나무터널 속은 희한하게도 여름엔 냉장고 속 같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아늑한 곳이다.
그곳을 지날 때면 언제나 먼 추억이 아스라이 떠올라 은밀하게 혼자 생각에 잠기는 곳이기도 했다. 갓 스무 살 청춘이었을 때, 사랑이 막 싹트려고 했을 때, 무엇을 봐도 온 세상이 아름답게 총천연색으로 다가왔던 그때… 나만이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추억이 있다.
흙길을 걸으며, 들꽃을 보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더위에 진초록으로 변하는 여름을 맞고, 우수수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을을 느끼고 겨울엔 바람이 좀 불지만 산책길을 걷는다. 이 산책길 안에는 사계절이 다 있어,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도 나이 들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흙길을 걸어가니 발걸음이 가볍고 걷는 촉감이 너무나 좋다. 왼쪽으로 들어서면 소나무 아래 약간의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는 벤치가 놓여있다. 몇몇 친구들과 맨손 체조를 하며 여학교 조회시간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곳에 통나무 커피 집이라도 있다면 만남의 장소로는 최고일 텐데… 외로운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 주고, 꽃 이야기도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소이다.
유난히 소나무가 많아 공기가 맑았고, 수백 년쯤 되었을 우람한 떡갈나무가 산책길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걷노라니, 언제 나타났는지 코요테가 마치 길라잡이처럼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섬뜩했지만 코요테는 작은 짐승이나 잡아먹는다 해서 약간 안심을 하긴 해도 사라질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보았던 소나무는 냄새가 좋아 송편 찔 때 솔잎을 깔고 쪄냈던… 그 송편 맛이 어렴프시 떠올랐다. 송진 냄새와 나뭇잎 썩는 냄새가 코끝에 닿아 습습했다. 종종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쭉 뻗은 나무줄기 끝에 꿰인 하늘이 가없이 깊었다.
이 길을 걷노라면 낯익은 한국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걷는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반갑고, 따뜻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니 행복해진다. 어쩌다 매일 오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웬일인가 궁금하게 된다.
육십 쯤 돼 보이는 남자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길 한번 안 주고 혼자 열심히 걸어갔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해봤지만, 그는 무심히 지나쳤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기분이 상해 나도 무심히 지나쳤다.
어느 날, 한참을 그가 보이지 않아 산책길에 소식통인 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다. 간경화가 심해져서 얼마 못산다는 말을 듣고도 마지막까지 산책을 씩씩하게 하다가… 입원을 며칠 하고… 그리고는 떠났다 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모르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 어쩌면 인사도 안 하는가 하고 내심 괘씸하게 생각했던 일이 미안했다. 남의 사정을 모르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했다.
이렇게 한참을 안 보이는가 싶으면 하늘나라에 갔다거나 양로원으로 갔다는 쓸쓸한 소식들을 듣게 된다. 이래서 산책길은 마치 인생길 같기도 했다. 산책을 하고난 날은 왠지 숙제를 한 기분이 들어 하루가 마음도 몸도 가쁜 해진다. 산책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걷는 것이 건강에 최고라며 오늘도 씩씩하게 걷고 있다. 언젠가는 나도 이 산책길에서 떠날 때가 오겠지만, 되도록 오랫동안 걷고 싶은 것이 나의 속마음이다.
여러 인종들이 각가지 종류의 강아지들을 끌고 산책하는 모습들이 생기 있어 좋다. 산책길에서는 모두가 친절하고”Good morning!”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이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산책길의 풍경이다. <*>
2020.01.27 11:26
산책길의 풍경- 윤금숙 소설가, 포터랜치 거주
조회 수 169 추천 수 0 댓글 0
TAG •
- vknews.net,
- 밸리,
- 밸리코리언뉴스,
- 밸리한인업소록,
- 밸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