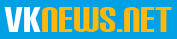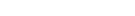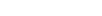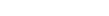유리창은 물론 문까지 박살이 나고 가게 안은 완전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이 마치 유령처럼 와글와글 서로 부딪치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바닥에 깔린 옷가지들을 밟고 또 밟으며, 걸려 있는 옷들을 끌어내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깥 역시 난장판이었다, 여기서는 이리 뛰고, 저기서는 저리 뛰고 이것저것 물건들을 잔뜩 든 인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경찰차가 번쩍번쩍 불을 켜고 정차해 있었고, 정복을 한 경찰관들이 여기저기에서 서성거렸지만, 아수라장을 막지는 못했다. 아니, 막을 생각 같은 건 아예 없는 것으로 보였다.
가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고, 상가 건물 지붕 위에서는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비쳤다. 미국 언론들은 그들을 ‘지붕 위의 사나이들’이라는 부정적인 명칭으로 불렀다.
1992년 4월2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폭동 때, 나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 매달려 한국방송을 보고 있었다. 눈을 뗄 수 없었다.
순간, 한 아이가 화면에 가득 잡혔다. 얼굴이 까무스름한 히스패닉 사내아이였다. 네다섯 살쯤이나 되었을까? 아이는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몸을 바싹 오그리고 살금살금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가슴에 넘쳐나게 옷가지를 움켜 안고 있었다.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옴츠러들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스산한 바람이 나를 휩쌌다고나 할까?
한 순간 아이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 아주 짧은 순간…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아이가 지금도 잊히지 않고, 엊그제 본 듯 눈앞에 생생하다. 표정 없는 얼굴에 뻥 뚫린 커다란 두 눈망울이 유난히도 나를 슬프게 했다. 어느 땐, 그 어린 눈망울이 가슴 저리는 아픔으로 다가와 나를 괴롭히기까지 했다. 나도 모르게 시를 썼다. 그 눈망울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어린 눈망울>
가게 안은 온통 아수라장 무법천지
두 팔 벌려 한 아름씩 옷가지 움켜잡고
서로 부딪치며 우왕좌왕 야단법석
눈알 부라리며 두리번거리는 인간들…
깨진 유리 사이로 몸 바싹 오그리고
살금살금 걸어 나오는 사내아이 하나
너덧 살쯤이나 되었을까
가슴 넘쳐나게 움켜 안은 옷가지
표정 없는 그 얼굴에
뻥 뚫린 커다란 두 눈망울…
텔레비전 화면에 언뜻 스치고 지나간
그날 4.29의 슬픈 장면, 그 눈망울…
30년이나 지난 지금도
가슴 저리는 아픔으로 여전히 거기 머문 시선
자꾸만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아이의 눈망울…
30년이나 지나 이제는 어른이 되었을 그 아이의
자식들도 뻥 뚫린 커다란 눈망울 가졌으려나?
지금, 그 아이는 30 중반의 청년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날의 일을 기억할까? 그날은 총성까지 울리고 바깥 역시 난장판이었으니 아마도 기억에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이가 야윈 얼굴에 두 눈만 유난히 크게 보인 건, 어쩌면 영양실조 때문일지도 모르니, 보이는 나이보다도 한두 살은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억을 할 수도 있겠다.
기억을 하건 못 하건 간에, 내가 왜 이리 깊이 생각을 하는지…….
그날, 아이는 아마도 엄마를 따라 그 상점 안에 들어갔을 게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옷가지를 잔뜩 움켜쥐게 되었을까? 엄마가 아이에게 옷가지를 잔뜩 움켜쥐게 하고는‘너는 나가 있어’라고 그랬을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어른이 된 그 아이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다.
커다란 두 눈망울에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어딘지 모르게 무척이나 선하게 보였던 아이, 엄마가 아무리 무책임했다 하더라도 나쁘게는 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
예쁘고 야무진 여자와 결혼을 하여, 큰 눈망울의 아이가 둘쯤 딸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은 슬픈 눈망울이 아닌, 기쁨 가득한 눈망울이기를... <*>